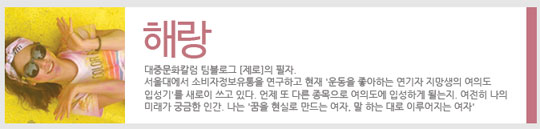죽음과 삶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국립현대무용단의 '이미아직'
[문화가 있는 날·예술이 있는 삶을 빛냅니다…문화뉴스]
한창 중2병이 진행되는 중학교 2학년 시절 나의 고민의 주제는 주로 죽음이었다.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며,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그 뒤로도 나는 종종 죽음에 대해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내가 불치병에 걸린다면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억지로라도 치료를 해야 할까? 그런데 이상했던 건 죽음으로 시작된 고민이 결국에는 삶에 대한 답으로 끝난다는 것이었다. 항상 죽음으로 시작한 질문은 결국 돌고 돌아서 '그래 지금 현재 이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가 답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과 답을 오래 반복한 후 깨달았다. 삶과 죽음이 하나의 선 위에서 반복되는 것으로 삶과 죽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국립현대무용단의 <이미아직> 역시 삶과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전통 장례문화에 등장하는 꼭두를 모티프로 하여 산 자와 죽음자의 경계의 불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꼭두는 이쪽과 저쪽의 경계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나라 전통 장례식에 사용되는 상여를 장식하는 나무 조각상이다. 즉, 꼭두는 이 세상에 사는 인간과 이 세상이 아닌 초월적 세상이나 존재 즉, 사후 세계나 죽은 이를 연결하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 꼭두라는 존재 자체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고 있다는 데에서<이미아직>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음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남자무용수들이 오랜 시간 격하게 춤을 추는 장면에서 삶과 죽음이 묘하게 공존하고 있음을느꼈다. 격한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그사이를 가로지르는 정적인 걸음걸이의 무용수 몇. 누군가에게는 삶이 격렬하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격렬하다. 그 격렬함의 정도를 비교할 수 없고, 살기 위한 격렬함인지 죽어감의 격렬함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타인의 격렬함은 무관심의 대상이고, 그들은 무관심하게 자신들의 길을 간다. 아주 정적으로 그 격렬함 사이를 가로지른다.
넋전이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우선 신문으로 장례 도구를 만든 것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다. 넋을 위로하고, 부르고, 보내는 도구들을 모두 신문으로 만들었다는 데에서 현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조장하고, 또 그 죽음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미디어들을 풍자하는 느낌도 들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미디어는 소통이 가능한 연결고리이다. 죽은 이들과 산 이들, 그리고 산 이와 산 이가 소통할 수 있는 추상적인 장소이다. 어쩌면 미디어는 현대 사회에서 꼭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일 지도 모른다.
장면과 도구, 무용수들의 몸짓, 음악, 영상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해석하기엔 나의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무용수들의 몸짓에서, 음악에서, 영상에서, 도구에서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고, 동시에 누군가의 죽음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죽음과 함께 현재를 살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한 느낌은 공연 마지막 부분을 접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용솟음쳤다. 그 전율을 글로 전할 수도 없을뿐더러, 직접 느끼는 것이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직접 공연을 보고 느끼는 것을 추천한다. 그 전율을 단순하게 문자화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그 느낌으로 공연 소감을 대신하고자 한다.
"타인의 죽음과 삶이 당신의 죽음과 삶과 다르지 않으며, 당신은 이미 그 공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느껴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들을 안아주어라. 당신이 당신을 안아주는 것처럼…"
#문화뉴스 아띠에터(Art'ietor) 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