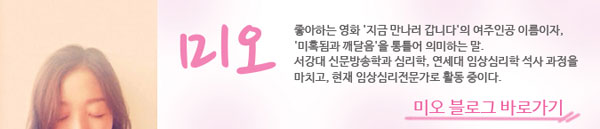[문화가 있는 날·예술이 있는 삶을 빛냅니다…문화뉴스]
주말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가 길었던 53부작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라임 저녁 시간에 방영되고, 비슷한 시간대 뉴스를 배치해둔 타채널이 많다는 이점이 있긴 했지만, 여러 다양한 채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요즘으로는 높은 시청률을 고수하는 게 쉽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 와중에 40%의 시청률을 유지했던 이 드라마는 지난 2014년 연말에도 대상을 시상한 유동근을 필두로 연기대상을 휩쓸었다.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은 단순하고 어찌 보면 고루했다. 홀아비로 자식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은 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기적이고 못 미덥기 그지없는 세 남매를 인간 만들기 위해 '불효 소송'을 건다. 그 과정에서 가족이기에 당연스레 여기며 인식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하는, 전형적인 휴먼 가족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전에도 유사한 포맷과 주제의 작품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이 작품의 조금 더 특징적인 면이라면 요즘 사회에서 주목받는 코드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다.
50부가 넘는 시간을 거쳐오며 아버지 순봉(유동근 분)의 기대대로 철없고 이기적이던 삼남매는 성장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실은 그들의 아버지 또한 함께 성장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대학에 다니고 집을 장만하는 일이 빛투성이가 되어야 하는 지금의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는 더디게 성장하고 독립을 미루며 그저 몸만 커 간다. 전쟁 같은 취업에 앞서 학교 졸업을 미루는 것뿐이 아니라 나이만 먹을 뿐 '하나의 어른'이 되는 것을 점차 미루고 있다. 평균 결혼 연령도 점차 늦어지는 요즘, 어느 순간 우리들의 부모가 결혼을 하고 나를 낳아 키웠던 것은 지금의 내 나이보다도 젊었던 시절이었구나, 그때는 마냥 크기만 해보였던 그는 어떻게 그렇게 크나큰 책임감을 가진 채 가정을 꾸리고 지탱해 갔을까, 그 나이를 성큼 넘어선 지금의 나는 아직도 이렇게 어리고 나약하기만 한데, 이런 안쓰러움을 문득 느끼는 순간도 온다.
 | ||
하지만, 이처럼 어른이 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그들의 부모이기도 하다. 가족을 보듬고 부양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높게 지닌 우리의 부모 세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효(孝)'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부모를 봉양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녀를 책임지려는 마음마저 쉬이 놓지 못한다. 위아래로 기댈 곳 없는 이 세대가 나이를 먹은 지금에 와서는 대단하면서도 또 안쓰러워지는 이유이다.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순봉은, 막내 아들 달봉(박형식 분)에게 두부 가게를 맡기고도 마음이 편치 않다. 30년간 매일 이른 새벽 시간에 일어났던 그는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탈 없이 가게를 열렸을지 아들을 걱정하다. 몸만 병원에 있지 마음은 온통 그곳에 가 있는 채로 새벽 시간을 지새우는 그. 안타깝게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늦잠을 잔 막내는 가게 앞에 와 기다리던 단골손님들을 모두 바람 맞힌다. 더군다나 급한 마음에 정해진 시간을 넘겨 너무 불어 못 쓰게 된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넘기는 바람에 30년 단골을 잃게 될 지경에 이른다. 지금 당장이라도 링거를 빼고 병실을 박차고 나가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아버지에게 둘째 강재는 말한다. 아버지는 지금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이고, 그 문제는 그 애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언제까지 그 뒤치다꺼리를 아버지가 해주실 수 있겠냐고.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말에 순봉은 '그래 (곧 죽을) 내가 언제까지 살펴줄 수 있겠냐'며 가라앉는다.
달봉은 자신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 병원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고민하던 그는, 결국 병실에서 나와 뒤에서 아들내미를 지켜보던 아버지의 작은 도움이 있기는 했지만, 망가졌던 상황을 스스로 되돌려 놓는다. 아마 그것은 그가 아버지나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낸 첫 경험으로 기억할 테고, 이 난관을 헤치고 자신이 벌려놓은 실수를 해결해 가는 홀로서기 과정을 거치며 그는 성장했을 것이다.
드라마 전반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은 등장인물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아버지의 병에 대해 알게 되는가이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병을 밝히는 문제에 있어, 순봉은 답답할 만치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다. 결국, 가족들은 하나하나 아버지의 상태를 알아가면서도, 서로에게 모른 척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알게 된 순봉의 동생 순금은 슬픔과 배신감에 오열한다.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고 찌푸린 얼굴로 서로 보기보다 그저 웃으며 행복한 시간으로 채우게 하고 싶다는 순봉은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언제까지 그가 모두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을까. 남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각자가 스스로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이를 상실하는 아픔을 감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필요하다.
 | ||
해피엔딩을 바라지만 순봉은 결국 생을 마감한다. 하지만, 나는 그가 살기를 바라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건 기적일지 모르고 어쩌면 가상의 미디어 속에서라도 그러기를 바라는 누군가들의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요원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더 좌절시키는 일이 될지도 모르기에.
영원히 살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기억과 사랑이 영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다시 생을 살아내는 것.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또 견뎌내며, 어쩌다 어른이 된 우리는 조금씩 더 자란다. 그래서 드라마는 마지막에 '새로운 생명과 가족의 탄생'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해피엔딩을 보이며 막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고, 또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는 위안을 받고 기운을 얻어 하루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상실을 받아들이고 지나온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만남이고, 그만큼 생과 죽음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말이다. #문화뉴스 아띠에터 미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