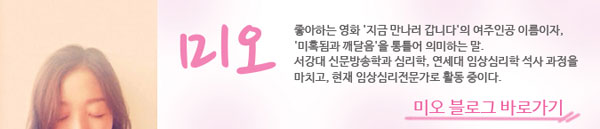[문화뉴스]
어제는 엄마의 생일이었다. 부모님이 태어나신 날이니 으레 '생신'이라 하는 게 맞겠지만, 언제나 그래 왔고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을수록 친구 같고 연인 같은 엄마가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부르고 싶었다.
스케줄을 조정해 일을 일찍 마치고 강남에서 일산집까지 달려갔건만 저녁을 먹으면서부터 우리 모녀는 투닥거리기 시작했다. 서로 공강 시간을 맞추어 매주 월요일 데이트를 하는 캠퍼스 커플인 막내 동생이 일찍 들어올지 묻자, 역시나 누구보다 그녀다운 멘트로, '엄마 생각해서 일부러 그럴 것 없어. 정말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재미나게 놀다 들어오렴.'이라고 대답했다는 엄마의 말에 내가 뿔이 나서였다. 그래 버릇하면 좋지 않다고, 자식들이 엄마 뭐 사준다고 할 때는 괜히 아무것도 필요 없다 거절하지 말고 기분 좋게 받고, 엄마는 뭐든 다 이해하고 괜찮은 사람인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수백 번을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 없다.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처럼은 안 할거라고, 그건 꼭 내가 대우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라고 배운 티 내며 입바른 말을 해 봐야, '그래 어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엄마가 꼭 볼게. 엄마 딸인 네가 어디 갈까.'라며 할 말 잃게 하는 그녀이다. 다행히 눈치 있고 착한 동생들은 엄마의 만류(?)에도 그리 늦지 않은 시간에 케이크를 들고 귀가했고, 우리 다섯 가족은 단란하고 평화로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요새 내가 잘 들고 다니는 걸 눈여겨보며 마음에 들어 하시던 양가죽 클러치, 화장을 잘 하지 않는 엄마가 편하게 쓰시겠다 싶어 한번 드렸더니 웬일로 하나 더 사주면 좋겠다시던 립 트리트먼트를 준비했지만, 사실 제일 야심하게 계획했던 딸의 선물은 '엄마와의 사진전 데이트'였다.
 | ||
린다 매카트니전.
몇 주 전 사진전 광고를 보셨다며 가보고 싶다던 엄마 말에, 원격으로 핸드폰 인증번호까지 받아가며 대림미술관 회원가입을 엄마 것까지 해두고는 함께 갈 수 있는 날이 있으려나 노리던 참이었다. 아무래도 평일에 함께 가긴 무리일 것 같아, 혼자라도 붐비는 주말 말고 오롯이 한적한 평일의 문화 여유를 즐겨 보시라고 이야기해 두긴 했지만, 은근 행동력이 높지 않은 엄마는 사진전이 끝나는 봄이 되어서야 가볼까 말까 고민하다 놓쳐버릴 것만 같았다. 결국, 보고 싶었던 전시이니 꼭 함께 가서 보자고 말했던 그에게 괜찮겠냐고 양해를 구하고는, 선뜻 어머니와 다녀오라고 오케이를 외쳐준 덕분에 생각했던 대로 엄마와의 데이트를 추진했다.
폴 매카트니가 소울메이트라 여겼던, 30여 년을 그의 아내이자 사진작가로, 또한 지금은 장성한 네 아이의 엄마로 살다 많지 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던 그녀, 린다 매카트니. 그녀의 이번 사진전은 누구보다 아름답고 열정적이었던 그녀의 삶, 그녀 자체를 담고 있었다. 작은 미술관의 2층부터 4층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사진작가로서 그녀의 대표작이었던 세기의 뮤지션과 아티스트들의 모습을 담아낸 '1960년대 연대기' 섹션부터 사회에 대한 그녀의 시선을 담아낸 사진들, 그녀의 가까이 있던 아티스트들이 바라보았던 그녀의 모습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매카트니 가족의 삶을 담아낸 기록들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비틀즈와 인연이 닿고, 폴과 연인, 그리고 부부가 되어 그녀가 그려내었던 삶. 그들은 어쩌면 당시 세기의 셀레브리티였지만, 그녀의 시선을 통해 담아낸 폴과 네 자녀는 그저 너무도 사랑하는 한 남자와 나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언제나 사진기를 들고 그들을 피사체로 담았던 그녀는 사진 속에 매우 드물게 등장하지만, 그 사진들은 그녀의 모습을 직접 내보이지 않더라도 여실히 '그녀의 삶'을 담아내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의 순간 순간을 그녀가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그대로의 느낌으로 담아내고 싶었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사진전의 부제처럼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의 기록'을 우리에게 조금 꺼내어 보여주는 느낌으로 말이다.
전시를 보고 내려와 1층의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았다. 기념으로 도록을 하나 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었지만, 엄마와 내가 동시에 '이게 가장 좋았어'라고 가리켰던 사진-린다, 폴, 그들의 딸 매리의 자화상-이 엽서로 있어 한 장 골랐다. 그리고 근처의 아담한 카페에서 점심을 기다리며 짧은 메시지를 적어 엄마에게 건네었다.
12월이 된 생색을 마구 내듯 갑자기 계획에 없이 추워진 날씨였지만, 그 덕에 엄마의 코트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서로 손을 꼭 쥐고 걸어 더 따뜻했던, 말랑말랑해진 가슴으로 '오래 살라는 말 싫어할 엄마인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 딸이어서 행복하니 건강히! 오래오래 내 엄마로 살아줘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완벽한 평일 오후의 데이트였다.
 | ||
린다 매카트니전은 내년 4월 26일까지 열린다. 올 2월까지 '라이언 맥긴리'의 사진전을 열기도 했던 대림미술관은 작지만 알찬 규모로 종종 우리가 반겨할 전시를 열곤 한다. 별 볼거리 없이 가격만 높아 미술관을 나서며 아쉬움의 입맛을 쩝 다시게 하는 전시가 있다면, 대림미술관은 변함없이 따뜻한 애인처럼 5000원 정도의 티켓 가격을 유지한다. 그것도 회원 가입만 한다면 1人당 1티켓 3000원으로 친절한 할인까지. 더불어 전시가 내려가기 전 언제라도 소지했던 티켓을 그대로 들고 여러 번 다시 찾아도 되는데, 오늘 전시장 앞에 쓰여 있는 안내를 보니 '전시장 안에서 찍은 본인의 인증샷'을 보여주어도 재입장 가능하다니, 너무 욕심 없고 귀여운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다.